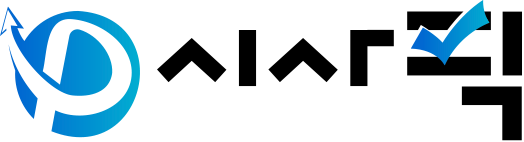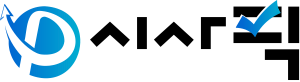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어제 지인 두 분과 연천군 소재 고대산자연휴양림에 다녀오면서, 우리는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천은 접경지역이어서 그런지 군 부대만 많고, 공장이나 큰 건물은 거의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 중 한 분이 서울에서 고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보더니 110km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한 지인이 사람의 심리적 저항거리가 100km라면서 고대산자연휴양림이 심리적 저항거리 100km을 벗어나 있어, 이용객들에게 조금은 부담되는 거리라고 말했다.
그 지인은 본인도 집에서 100km가 안 되는 곳에 있는 천안의 처갓집에 갈 때는 부담이 덜 되는데, 대전에 사는 지인 집에 갈 때는 부담이 된다고 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 태어난 곳에서 반경 100km 안에서 자라고, 반경 100km 안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고, 반경 100km 안에 사는 베필을 만나 결혼하고, 반경 100km 안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자신의 몸과 그 몸이 태어나고 자란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나온 것이 잘 맞으며, 그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어렸을 때 할머님의 이야기가 꽤나 지혜로운 말씀이었다고 할머님 자랑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행은 아내 고향이 300km쯤 되어서 사이가 안 좋다느니, 100km 안에서만 살았던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건강이 좋았다는 등, 모든 상황을 100km 프레임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불현 듯, 나는 고향 마을에서 태어나 이웃 마을 여성과 결혼한 후, 직장도 100km 안에 있는 도시로 다니면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만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사촌동생이 남보다 여유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심리적 저항거리 100km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내 나름의 판단을 했다.
나도 지방에 갔다 귀가할 때, 우리 집 반경 100km 안에 들어오면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안정감을 찾았던 경험이 있고, 주말에 아내와 다육이 농장에 갈 때도 100km 반경에 있는 농장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면 조금 불안하지만, 100km를 넘지 않으면 안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물론, 직업이나 환경이나 성격에 따라 사람의 심리적 저항거리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100km가 심리적 저항거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대부분 반경 100km를 벗어나지 않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심리적 저항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기에 좋은 행정구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태어난 지자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정책을 펴기에 쉬운 나라라는 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했던 기성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우리 후세들이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심리적 저항거리 100km가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초스피드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어제 일행과 헤어지면서, 심리적 저항거리 100km 안에 살고 있는 딸과 아들 덕에 더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단상]
나 자신의 심리적 저항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